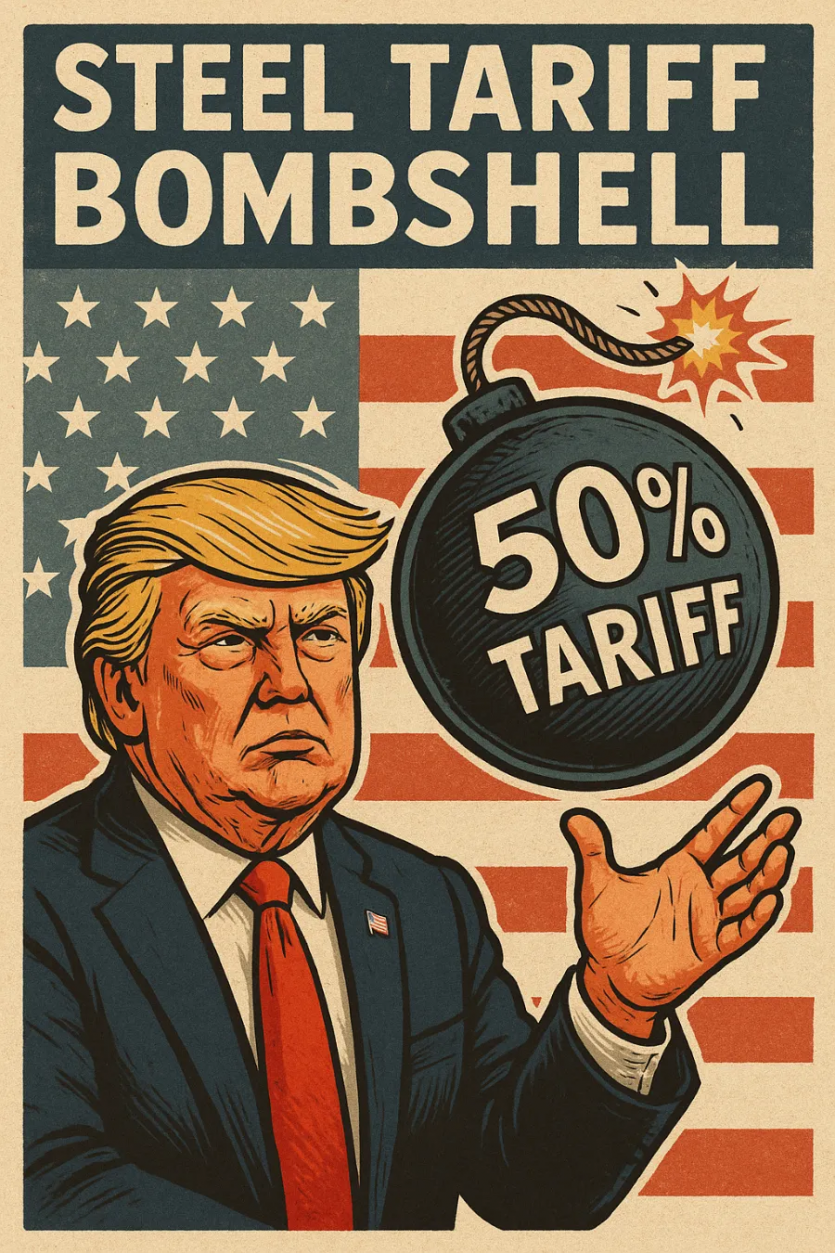[ICTC 분석기사] 트럼프, 상호관세율 추가 조정 단행, 한국산 8.7일부터 15% 관세…“우회수입엔 40% 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4회 작성일 25-08-06 16:46본문
[ICTC 분석 기사=2025.8.3]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국 포함 주요 20여 개국 대상 고율 추가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기존 행정명령(EO) 14257(2025년 4월 2일)에 따라 도입한 상호관세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행정명령을 새롭게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율 인상을 넘어, 미국의 전략산업과 공급망을 위협하는 특정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우회수입(transshipment)에 대해서는 최고 40%의 징벌적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의 ‘국가안보 기반 무역정책’, 한층 강화돼
행정명령 제1조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명확히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체제를 가동했다. 이후에도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충분한 양보를 보이지 않거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함에 따라 이번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EU, 영국, 스위스, 남아공, 이라크 등 광범위한 국가군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설정함으로써 ‘협상 카드’로의 관세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 국가별 추가 관세율…한국 15%, 인도 25%, 라오스·미얀마는 40%
이번 명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국가별로 차등화된 Annex I 추가 관세율이다. 각국의 미국산 수입 규제 수준, 대미 무역수지, 전략품목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율이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15%,
-인도는 25%,
-동남아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는 19%,
-베트남과 대만은 20%,
-남아공과 리비아는 30%,
-라오스, 미얀마는 무려 40%에 달하는 고율이 적용된다.
EU의 경우 특수 규정이 적용돼, HTSUS Column 1 기준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미만인 품목에는 ‘15%까지 도달하도록’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 ‘우회수입’엔 징벌적 관세와 제재 조치 예고
이번 명령의 3조는 미국으로의 우회수입(transshipment)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철퇴 조치를 명시했다. 미국 세관(CBP)이 특정 국가를 통한 우회수입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화물에는 40%의 초고율 추가관세가 일괄 적용되며, 기존 관세 전액에 더해 감면도 불허된다.
또한 CBP는 6개월마다 우회수입 경로 및 관련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며, 해당 명단은 향후 공공조달, 국가안보 심사, 기업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 관리 차단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협상 여지 남겨둔 전략적 설계…韓 기업 신중 대응 필요
흥미로운 점은 양자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정이 체결되면 별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호관세를 대미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행정명령은 발효일을 8월 7일 0시로 설정하면서도, 10월 5일 이전 선적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을 적용하는 유예 규정을 포함했다. 미국행 수출물량이 많고 선적일정이 유동적인 한국 수출기업으로서는, 단기 선적 일정 조정을 통해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식 무역정책의 귀환…FTA 활용과 CBP 대응체계 중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주의 기반 무역정책의 정점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HS Code 개편, FTZ 활용, FTA 관세 경감 제도, 우회수입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입체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CBP의 판정 권한 강화 및 우회수입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은 기업의 수출 프로세스와 원산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작성자: ICTC 국제원산지인증원 원장 김석오 박사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 관세전쟁 #원산지 #국제관세 #ictc #무역공급망
- 이전글[김석오 칼럼] 스타트업 CEO, 기술보다 영업이다 25.08.08
- 다음글[미국, 800달러 이하 직구물품 관세면제 폐지…비상업용 100달러 이하 선물은 예외..8.29부터 전면 시행 25.08.06